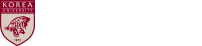소 식
언론보도
세계시장 추세 따른 한국 수경재배 발전 방향(박권우 명예교수)
Views 1076
|2025.04.02

세계의 수경재배 시장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 155억 7천만 달러에서 2029년에는 약 290억불로 증가돼 연평균 성장률은 13.7%가 된다고 예측한다. 이와 같은 예상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과 함께, 수직 농업(버티칼 팜)시스템, 박막수경(NFT), 분무수경 같은 수경법의 발전, 그리고 국내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유기 수경재배가 견인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세계 수경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나 2030년에는 전세계시장의 35.6%를 점유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존의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중국, 인도, 중동지역에서 수경재배 면적의 빠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재배되는 수경 작물 중에 토마토 재배면적이 약 44%로 가장 많고, 허브 17%, 상추 16%, 오이류(오이, 멜론 등) 11%, 고추류(피망, 파프리카, 고추 등) 3%, 기타 8% 순서이다. 세계인이 수경재배 작물을 선호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져 먹거리의 안전성이 문제 인데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안전 고품질 식품으로 소비자가 인식하여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농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에 따라 수경 채소재배면적은 2010년초에 약 1,000ha에서 2020년 초에는 약 4,000ha로 지난 10년간 약 4배가 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증가는 2010년대 딸기 재배 면적이 약 100ha 정도였는데 현재는 약 2,000여ha에 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채소 수경 면적은 일본 약 3,000ha를 추월했고 네델란드 약 4 500ha를 수년 내에 추월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경재배는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비친환경적인 수경재배이다. 이는 네델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은 2004년부터 공급하는 양액을 완전 재이용하는 순환형으로 전환했는데 한국은 재배 면적의 약 5%만 순환형이기 때문이다. 비순환형은 코이어나 암면을 이용한 고형배지경에서 공급한 양액의 약 20% 정도를 토양으로 흘림식으로 재배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1ha 당 약 2,000톤의 양액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고 여기에는 약 5톤의 비료가 함유돼 있다.
한국은 2023년 채소 수경재배면적의 약 90% 이상이 고형배지경이니 3,600ha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양액은 약 7백20만톤, 비료는 약 18,000톤이 지하수로 들어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순환식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순환장치 설치는 비용이 많이 필요해 농가들이 전환을 기피하니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수경채소는 2023년 재배면적 대비 딸기 60%, 토마토 21%, 파프리카 13%로 3개작물이 93%를 차지할 만큼 편중돼 있다.
이는 수익률이 딸기와 토마토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딸기가 채소이나 한국,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과수로 취급한다. 세계시장에서는 토마토, 허브, 상추, 오이, 고추의 순서로 점유율을 나타내 샐러드에 사용하는 바질, 고수 등 허브가 두번째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최근 양어와 수경재배를 병행하는 아쿠아포닉이 새로운 수경 재배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않고 물고기 분뇨로 재배하는 순환식이라 친환경 수경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수경재배 현황에 비춰서 한국 수경재배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발전을 했으면 한다. 먼저 국내는 수경재배와 토양재배 생산물의 구별을 하는 경매가 없지만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수경 상품은 반드시 표시를 해서 출하해야한다. 두번째, 세계적 추세로 보아 바질 등 신선 허브 수경재배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기수경을 인정하는데 앞으로 유기 수경비료를 사용하는 유기 수경도 발전의 여지가 있어 사업체나 농가는 대비를 해야한다. 넷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비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순환식 양액재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시설비 보조가 필요하다.
끝으로 농가는 수경재배는 초기 시설비가 필요하고 다양한 기계를 다뤄야 하니 자본과 충분한 수경재배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출발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 이외 여러 문제가 있지만 농가들특히 젊은 귀농인들의 수경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한국의 수경재배는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